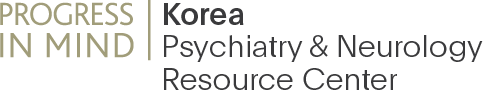체중 관리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무척 노력을 하지만 어이없이 무너져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나서는 후회하고 자책을 한다. 그 후회와 자책은 다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특히 우울과 불안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 먹는 것의 통제에 대한 어려움과 자책, 체중 관리를 잘 하지 못해 생기는 신체 이미지의 변화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은 일상생활 변화를 통한 회복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한 환자일수록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을 탓한다. “먹는 것 앞에서는 의지가 약해져요.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라며 자책을 한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서적 허기(emotional hunger)’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신분석적 발달 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먼저 아주 갓난아기였을 때를 상상해보자. 모유수유를 받으며 엄마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안전하다고 여기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정서적 만족을 느낀다. 동시에 모유를 통해 배가 채워지면서 신체적인 허기도 충족된다.
엄마의 가슴에 닿아서 젖을 먹는 것은 육체적 칼로리 섭취 뿐 아니라 정서적 포만감과 안전감을 함께 얻는 행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엄마와 자신이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몸이 배가 고플 때 알아서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채고 울면 그제야 먹을 것이 들어온다는 현실을 깨닫는다. 아기는 서서히 배를 채우는 것과 엄마가 꼭 껴안아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서로 다른 루트라는 것을 익히면서 두 경험을 다른 영역으로 분화해서 발달시켜 나간다.
3세 이후에는 해마가 안정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삽화기억을 저장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이전 연령대에 있었던 일은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편도를 포함한 기타 뇌의 다른 부위에는 위의 두 가지 경험이 분화되지 않은 채 하나의 형태인 암묵적 기억, 혹은 정서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게 된다.
이 정서적 기억은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의식화된다. 바로 우울,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을 경험할 때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러나 대인관계 만큼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 만날 사람이 여의치 않거나, 관계의 갈등으로 욕구불만이 되었을 때, 과거의 정서적 기억이 소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 신체적 배고픔과 정서적 허기가 동시에 채워졌던 경험이다. 엄마와 나 사이의 애착 관계로 인해 느꼈던 만족은, 엄마가 옆에 없듯이 현재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충족되기 어렵지만, 먹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 혼자 할 수 있다. 바로 이 먹는다는 행위는 과거에 통합되었던 정서적 허기까지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보상 기전이 작동하게 되면 정서적 외로움, 우울, 고립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은 ‘정서적 허기’에 의한 ‘음식에 대한 욕망’으로 전환되어 인식되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빠른 시간에 많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정서적 결핍이 일시적으로 해소 된다. 더불어 음식 섭취를 통해 혈당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전반적 자율신경계의 안정화가 일어난다. 포만감과 함께 소화작용이 작동하면서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도 함께 일어나게 되어 안정 효과는 더 커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 자신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었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게 되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저 먹을 것을 먹는 것으로 ‘거짓 정서적 만족’을 얻었을 뿐,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애착, 정서적 만족은 충족하지 않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더 강한 자책과 후회로 이어지고 자존감 저하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뿐이다.
이런 이론적 개념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정서적 식이 척도(Emotional Eating scale)가 사용되고 있다.1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어떤 감정상태에서 식이 행동이 유발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분노와 짜증, 좌절 2) 긴장과 불안 3) 우울과 무기력 등이다. 자가보고 척도이며, 외로움과 소외감, 좌절과 낙담, 원망과 억울함 등도 문항에 포함 되어있다. EES (Emotional Eating scale)를 비롯한 정서적 섭식 측정 점수는 폭식 및 체중 증가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만일 정서적 허기가 환자의 우울, 불안, 좌절, 짜증과 연관돼 있다면 이 척도를 실시하거나, 이 척도의 일부 문항을 진료 중에 사용해 보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할 때 식이 충동 억제에 실패하고, 체중조절의 어려움이나 신체 이미지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라면 정서적 허기의 개념에 기반해서 평가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전체적인 순응도나 치료 만족도, 증상이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본 자료는 건국대학교병원 하지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으로, 한국룬드벡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